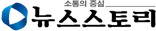이들이 느끼는 ‘나라’는 신뢰 못하는 거짓이라 체감하고 학업을 위한 학교가 아닌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
수능이후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며 ‘정상적인 나라’이길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는 현실이다.
정직함이 부끄러운 사회 속에 살고 있는 현실.
이 땅의 100만 국민들이 나선 것은 시대유감일 수밖에 없다.
다양한 목소리가 갈등의 원인이라면 이 또한 과정이고 합당히 견뎌야 할 민주주의의 방식인 것이다.
정작 갈등의 본질은 감추고 국민을 유린하고 있는 정치권의 일면 또한 우리가 처한 단면이 아닌가 한다.
‘위기는 곧 기회’인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얘기일 수 있을 것이다.
가진 것도 없고, 권력을 등에 업지도 못한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들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세상에서 쳇바퀴 도는 개.돼지였는지도 모른다.
넘지 말아야 할 울타리가 이것만 있을 것이라 희망하고 싶지만, 이 조차 기대감보다 체념하는 것이 빠르다는 판단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끼는 본능일 것이다.
가난한 언론 노동자들도 같은 현실이지 않을까?
지역언론은 대기업 지주 언론에 치여 ‘언론유린’의 질타를 함께 맞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폭주하는 각종 정보들 사이 지역 언론은 냉험한 현실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
종편이후 언론시장에 낄 수도 없는 지역 언론의 현실은 처참하기만 하다.
여기에 문화체육부가 ‘인터넷신문 취재 편집인력 5인 이상’을 골자로 제출한 신문법 개정안.
위헌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던 ‘인터넷 언론 신문 개정법’은 별것도 아닌 혼선으로 수많은 자유언론사들은 굶어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했다.
이것 역시 시작일 뿐이다.
인터넷 언론에 이어 지역 언론은 계속해서 대기업 지주언론사들의 탐욕으로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내세웠던 지역적 한계는 게으른 지역 언론의 핑계인 것이다.
이번 100만 촛불만 보더라도 우리는 너무 늦은 깨달았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지역을 넘어 진화해야 할 것이며, 실질적인 다양한 시도와 경험을 다시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소통한다.
소통의 방법은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 지역 언론은 소통의 수단으로 가장 좋은 도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